 대한내분비학회 지난 호 웹진 보기
대한내분비학회 지난 호 웹진 보기

유형준 CM병원 내과
글방 한쪽에 놓인 노트북을 켜고 묻는다.
“호르몬이란?”
머뭇거림 없이, AI가 답한다.
“몸의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다른 곳의 세포와 장기의 작동을 제어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
성마른 대답에 움찔하며 생각을 보탠다. 내분비는 외분비의 상대어다. 땀샘이나 침샘에서 땀과 침이 나오고, 간장에서 담즙이 흘러나오는 외분비엔 전용 분비관이 있다. 이와 달리, 내분비엔 전용관 없이 분비 물질이 이동한다. 내분비 일을 하는 장기를 내분비선, 또는 내분비샘이라 하고, 여기서 분비되는 성분이 호르몬이다.
중세의 고풍과 최첨단의 공존 속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선 다채로운 지적 교류가 펼쳐진다. 저녁노을이 스며드는 캠퍼스의 한 식당, 중년의 스탈링과 그의 처남 베일리스가 동료 생물학자 윌리엄 하디(William Bate Hardy, 1864~1934)에게, 최근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그즈음,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생리학 교수인 스탈링(Ernest Henry Starling, 1866~1927)[그림 1]은, 췌장 분비에 관한 실험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마침, 러시아의 심리학자며 생리학자인 파블로프(Ivan Petrovich Pavlov)가 소화생리학 연구 공적으로 190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장에 위산이 있을 때, 신경이 뇌를 통해 장벽에서 췌장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췌장액이 방출된다는 걸 증명한 파블로프의 연구 결과도 접했다.

스탈링은 처남 베일리스(William Maddock Bayliss, 1860~1924)와 함께 대장을 둘러싼 신경 조직을 제거하는 실험을 했다. 신경을 제거해도 췌장이 분비를 했다. 이 결과는 파블로프가 제시한 신경계 경로가 아닌 다른 시스템에 의해 췌장 분비가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에 위산이 존재하면 혈액으로 어떤 종류의 용해성 물질이 방출되고, 이에 따라 췌장 분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이 가정을 시험하기 위해, 개의 장 점막을 떼어 으깬 후, 장에 위산이 존재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산을 첨가하였다. 이렇게 만든 물질을 마취된 개의 혈액에 주입하자, 췌장 분비가 뒤따랐다. 두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위산이 들어 있는 장은 신경계가 없어도 분비했고, 분비가 일어나기 위해 장 조직이 제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 이로써 산에 대한 반응으로 장 조직에서 생성된 어떤 물질이, 혈액을 통해 췌장으로 가서 췌장액 분비를 자극함을 알아냈다. 두 사람은 장에서 생성되어 혈류로 운반되는 이 물질을 ‘세크레틴(secretin)’이라고 명명했다.
탈링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던 하디가 입을 뗀다.
“그렇게 혈액으로 방출되어 몸의 다른 부위에서 활동하는 작용물질을 일컬을 적절한 명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 사람은 거의 동시에 동의한다. 그러나 마뜩한 이름이 얼핏 떠오르지 않는다. 잠시 후, 하디가 제안한다.
“그러면, 우리 대학 고전학과 베시 교수를 만나보게.”
곧 스탈링과 베일리스는 고대 그리스어에 능통한 베시(William Trevor Vesey, 1854~1935) 교수를 찾아간다. 꼼꼼히 내용을 듣고 난 베시는 백지에 그리스어 단어 하나를 적는다.
ὁρμάω.
곧 글자를 읽으며 뜻을 풀어준다.
“호르마오(hormao). 흥분시키다’ ‘깨우다’ ‘촉구하다’ ‘움직이게 하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지요.”
1905년, 스탈링은 왕립 내과 의사 협회 강연에서, ‘호르마오’의 영문체인 ‘호르몬(hormone)’ 용어를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호르몬’이라 부르고자 하는 화학적 전달 물질은 혈류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운반되며, 유기체의 반복적인 생리적 요구에 따라 몸 전체에서 생성과 순환을 반복한다.”
호르몬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열네 해가 쌓인 1919년 5월 6일, 영국 고전학회 학술대회장.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캐나다의 윌리엄 오슬러(Sir William Osler, 1849~1919)[그림 2]가 회장으로 취임하며 강연했다. 오슬러가 세상을 뜨기 칠 개월여 전이었다. 아마 베시 교수도 그 자리에 참석했을 거다. 강연 제목은 ‘오래된 인문학과 새로운 과학’.
“여러분은, 갑상선이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물질을, 사회 전체를 위해 분비합니다. 인문학은 호르몬입니다. … 인문학은 철학, 문학의 모델, 민주적 자유와 미술 공예의 아이디어, 과학의 기초, 법률의 근거를 제공한 정신과 접촉하게 합니다. … 지금이나 어제의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불멸의 삶과 접촉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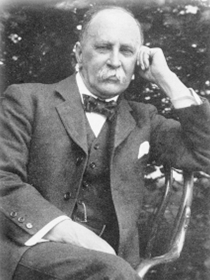
인문학이 호르몬? 오슬러는 왜 인문학을 호르몬이라고 은유했을까? 의사이자 고전학자인 오슬러는 강연을 준비하면서 ‘호르몬’의 어원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날 그 학회의 청중인 고전학자들의 인문학적 연구 학술 활동이 세상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 그것은 바로 ‘움직이게 하다, 촉구하다, 밀어붙이다.’라는 호르몬 본디 뜻의 발동(發動) 아닌가. 오슬러는 그 발동을 갑상선호르몬을 예로 들었다.
“아담의 사과 바로 아래에 있는 갑상선을 제거하면 인간은 사고의 원동력을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를 잃고, 점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일 년도 못가 치매에 빠집니다. … 만물의 영장이 볼품없고 서투른 인간으로 변합니다. … 인체는 각각 특정한 기능을 지닌 세포들이 윙윙거리는 벌집처럼 모여 있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뇌와 심장의 제어를 받으며 호르몬이라는 물질에 의존합니다. … 이 물질은 생명의 바퀴에 윤활유를 공급합니다.”
한 가지가 더 궁금하다. 오슬러는 여러 호르몬 중에 하필 갑상선호르몬을 택했을까. 그 까닭을 어림한다. 당시 내분비학은 초기 단계에 있었고, 특히 갑상선호르몬은 그 작용이 거의 밝혀지지 않아서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에 갑상선호르몬을 처방하는 경우도 미미했다. 따라서 꽤 진행한 점액수종(myxedema) 상태에서 지능 저하가 두드러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를 보는 일은 드물지 않았으리라.
호르몬과 인문학, 오슬러의 역설을 곱씹어 필자의 어투로 되짚는다. “인문학은 사회의 지성에 활력을 불어넣는 윤활제 역할을 한다. 갑상선이 한 개인의 지적 삶에 활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윤활제의 자극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메말라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방황하고, 갑상선호르몬이 없으면 개인의 심신은 멍청스레 가라앉는다. 인문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량의 호르몬이 한 사람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
인문(人文)은 글자 그대로 사람의 무늬다. 천문(天文), 지문(地文)과 함께 인간의 안팎에 존재하는 표현들 중의 하나다. 하늘의 무늬인 천문을 대하는 학문이 천문학이듯, 인문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다. 내면의 씨알, 생각이 드러내는 무늬를 살펴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글로, 호흡으로, 소리로, 몸짓으로, 걸음걸이로, 손짓으로, 색깔로, 눈빛으로, 양미간의 찌푸림으로, 드러난 무늬를 살펴, 육신, 감성, 이성, 지성, 영성을 헤아리는 학문이며 통로다.
의학 역시 인간의 무늬에서 시작하고 완결되는 분야다. 진료실에 들어서는 환자의 인상, 몸, 걸음걸이, 병력을 묻고 답하는 중에 파악하는 음성과 성격에서부터, 혈액, 소변, 영상 촬영 등의 검사에 이르기까지 드러나는 여러 무늬를 살피고 파악한다. 환자만이 아니다. 함께 온 보호자의 표정과 언행도 눈여기고 귀 기울인다. 이처럼 의학은 질병과 연관한 사람의 무늬를 진찰하고 분석하여, 건강과 생명을 깨우고 촉진한다.
내분비학은 다른 의학 분야보다 사람의 무늬와 관련이 더 깊다. 내분비 작동 물질인 호르몬은 사람의 무늬를 바꾼다. 예로,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게 갑상선호르몬을 투여하면, 멍한 두뇌와 눈이 맑아지고 맥없이 성긴 눈썹과 머리카락이 촘촘히 윤이 나며 푸석하게 부은 무심한 얼굴 윤곽이 또렷해지며 긴장을 찾는다. 호르몬이 인문에 생생한 윤활제 영향을 준 덕분이다.
그렇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무늬를 인문학이 바꿀 수 있듯이, 호르몬은 한 개인의 무늬, 인문을 바꾼다. 몸 안팎의 끊임없는 변화에 맞춰, 역시 쉼 없이 변해야 하는 호르몬의 윤활 역할이 자아내는 인문을 살펴 연구하고, 진료실에서 적용하는 의사가 내분비 의사다.
그날, 오슬러는 강연에서 다음 말을 보탰다.
“이른바 인문학자들은 과학이 충분하지 않고, 과학에는 안타깝게도 인문학이 부족합니다. 이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했을 불행한 이혼입니다.”

시인 (필명 柳潭(유담)) 및 수필가 / CM병원 내분비내과 과장 / 함춘문예회 회장 / 쉼표문학회 고문 / 한국의사수필가협회 회장 / 의학과 문학의 접경 연구소 소장
前
한림의대 내분비내과 및 의료인문학 교수 /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 대한비만학회회 회장 / 대한노인병학회 회장 /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 한국의사시인회 초대회장 / 문학청춘작가회 회장 / 의료와 예술 연구회 회장